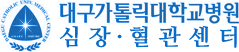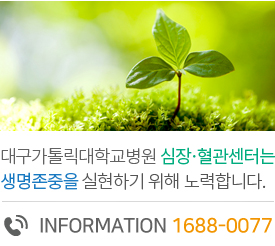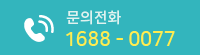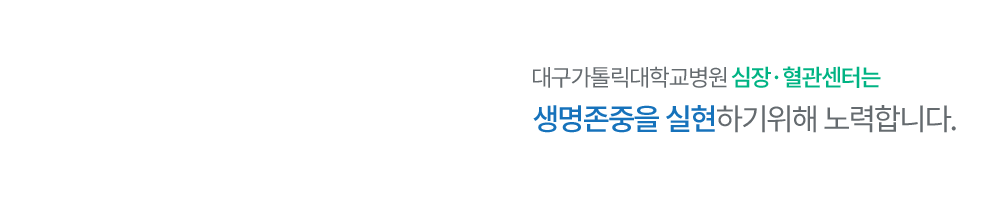
순환기내과
- home
- 관련의학정보
- 질병정보
- 순환기내과
부정맥이란?
심장은 스스로 박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기 세포에서 전기 자극을 만들고 이 자극이 심장 근육세포에 전달이 되면 심장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각 장기와 조직으로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는,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기관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잠들어있는 그 순간에도 쉬지 않고 박동을 지속하여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심장 박동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심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기 전달체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이 전기 전달체계를 심장전도계 (Cardiac conduction system) 라고 말합니다.
이 심장전도계의 기능 저하나 여러 변화에 의하여 전기 자극이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자극의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체계가 활성화되어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혹은 불규칙하게 되는 것은 부정맥 (不整脈, Arrhythmia)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원인에서든지 맥박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출처 : 대한부정맥학회]
판막질환이란?
심장을 바깥에서 보면 여러 개의 큰 혈관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큰 혈관들을 통해 피를 받기도 하고 온 몸에 피를 펌프질하기도 합니다. 또한 심장 내부는 4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심장이 우리 몸에서 펌프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피가 일정한 방향으로만 흘러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판막이며, 심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판막은 크게 4개가 있습니다. 승모판막, 삼첨판막, 대동맥판막, 폐동맥판막이며 이들의 구조나 기능이 비정상적일 때 판막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판막 질환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판막이 좁아져서 문제가 생길 때 (협착증)와 잘 닫히지 못하고 피가 셀 때 (역류증)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판막마다 병이 생길 수 있으며, 병명은 예를 들어 승모판 역류증 또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 이렇게 부릅니다.
판막 질환 환자들은 대부분 활동할 때 호흡곤란, 흉통, 전신 부종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며, 심잡음이 들리거나 또는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이상으로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병력 청취, 신체 진찰, 피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등의 검사를 시행하며 제일 중요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심장이 움직이는 형태를 초음파로 직접 관찰할 수 있으며, 판막이 새거나 또는 좁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판막 질환은 ‘병이 있다 또는 없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심한지’가 중요하며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과관찰 하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수술할 것인지, 약물 치료할 것인지, 빨리 수술할 것인지, 시술을 할 것인지 등등 치료 방향은 환자가 가진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 됩니다.
심부전이란?
심장은 온 몸의 피를 받아서 폐로 보내주고, 폐에서 온 피를 다시 받아서 온 몸으로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펌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활동 시 호흡 곤란, 전신 부종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으나 앞의 두 가지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호흡 곤란의 원인이 심부전 때문인지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 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부전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부전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심부전 원인 중에서,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좁아져서 그 결과로 심장 기능이 나빠지는 허혈성 심부전이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도 고혈압을 잘 치료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고혈압성 심부전, 부정맥으로 인한 심부전, 호르몬이나 판막 이상으로 생기는 심부전, 폐가 안 좋아서 생기는 심부전 등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병력 청취, 신체 진찰 이후에 피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심장 초음파 등을 기본으로 검사하며, 추가적으로 심부전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가 이루어 집니다. 보통 흔한 원인들부터 검사하게 됩니다. 추가 검사들 예로는, 운동부하검사, 심장 전산화 단층촬영, 폐기능검사, 24시간 혈압검사, 24시간 활동 심전도 검사, 심장혈관촬영, 심장 자기공명영상, 심장 핵의학 검사 등이 있으며 환자마다 다른 검사가 이루어 집니다.
병력과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부전 원인이 추정이 되면 원인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들마다 심부전 원인이 다르고 증상이나 심장 기능의 저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심부전 치료는 개인 맞춤 치료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 혈관이 문제라면 혈관을 넓혀 주는 시술이나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되었다면 혈압 조절이 우선입니다. 원인을 끝내 못 밝혀 낼 수도 있지만 심부전에 쓰이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으며 증상 완화, 예후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심부전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질병이며, 꾸준한 약물 치료와 더불어 식이, 운동 요법 등도 병행해야 합니다.
고혈압(Hypertension)
고혈압의 정의
(LINK https://vimeo.com/244774328/7a9aae2102)
심장은 펌프와 같이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을 보내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혈관 내에 압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박출할 때의 혈압으로 최고 혈압에 해당하고,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박동 사이에 이완할 때의 혈압으로 최저 혈압에 해당합니다. 혈압을 기록할 때는 수축기 혈압을 먼저, 이완기 혈압은 그 다음에 기록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혈압은 120/80mmHg 이하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최고혈압 140이상, 최저혈압 90이상인 경우를 뜻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고혈압학회에서 제시한 혈압의 분류입니다.
정상혈압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이고 확장기 혈압 80mmHg 미만
고혈압 전단계
수축기 혈압 120~139mmHg이거나 확장기 혈압 80~89mmHg
1기 고혈압 (경도 고혈압)
수축기 혈압 140~159mmHg이거나 확장기 혈압 90~99mmHg
2기 고혈압 (중등도 이상 고혈압)
수축기 혈압 16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 100mmHg 이상
고혈압의 원인과 종류
고혈압의 90~95% 는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본태성 혹은 일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5~10%는 원인이 밝혀져 수술이나 특정약물에 의해 치료할 수 있는 이차성 고혈압입니다.
(LINK https://vimeo.com/244774260/42c8636dbf)
일차성 고혈압
정확한 발생원인은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요인들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비만, 스트레스, 음주, 흡연, 고염식이 등 여러 환경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차성 고혈압
발생 원인이 있는 고혈압으로 고혈압 환자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원인으로는 신장질환, 내분비질환의 일부, 임신중독증, 자간증, 혈압을 상승시키는 물질을 분비하는 종양, 신경성 방광증, 요로 폐쇄증, 약물복용(소염진통제, 경구피임약, 스테로이드계 약물 등) 등이 있습니다.
고혈압의 증상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무언의 살인자(silent killer)라고도 하며, 합병증이 발생하여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고혈압의 증상으로 알려진 두통, 어지럼증, 코피 등은 고혈압 환자에서 나타날 수도 있으나 고혈압과 관계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흔히 두통, 특히 뒷목덜미 부분의 통증을 고혈압의 증상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뒷머리만 뻐근하여도 혈압때문이 아닐까 걱정을 하게 되는데, 두통이 고혈압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며 더욱이 두통의 정도에 따라 혈압의 높고 낮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고혈압이 심하면 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뒷머리가 아프거나 뻐근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침에는 상쾌하다가 오후가 되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뒷머리가 뻐근해지는 경우는 오랫동안 긴장상태에 있거나 신경이 예민한 사람에서 나타나는 긴장성 두통이 대부분입니다. 어지럼증은 고혈압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뇌순환장애나 부정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여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코피는 정상인보다 고혈압 환자에서 자주 터진다는 증거는 없으나 고혈압 환자에서 코피가 터지면 당황하여 혈압이 상승함으로 코피가 멎는 시간이 정상인보다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고혈압의 진단 및 검사
진단
고혈압은 진단을 내리기 전에 얼마간의 기간(4~6주)을 두고 몇 차례 반복 측정하여야 합니다.
- 가정혈압의 측정방법 (LINK https://vimeo.com/244774342/ae7d708138)
-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 유무를 확인합니다.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계질환의 가족력, 흡연, 식습관, 비만, 활동량 부족
- 이차성 원인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 신동맥협착증, 갈색세포종, 알도스테론증, 대동맥협착, 쿠싱증후군, 혈압상승 약물
- 고혈압으로 인한 장기손상(심장, 혈관, 뇌, 신장 등)을 확인합니다.
검사
- 혈액 검사: 콜레스테롤, 당뇨의 유무를 확인 및 간기능과 신장기능, 전해질도 확인
- 미세단백뇨: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 손상 유무를 초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
- 심전도: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의 영향을 확인
- 권장 검사: 심초음파, 안저검사, 경동맥초음파
고혈압의 치료
고혈압의 치료는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고혈압의 비약물치료
생활습관 교정 (LINK https://vimeo.com/244774297/ca53cb5201)
고혈압의 약물치료
(LINK https://vimeo.com/244774318/454d093174)
식사요법
-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닭고기, 생선, 두부, 우유(저지방)같은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녹황색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칼륨(K)이 풍부한 식품 (현미, 잡곡, 보리, 마늘, 양파, 검정콩, 토마토, 시금치, 호박, 우엉, 버섯, 고등어, 연어, 수박, 감, 딸기 등 과일류)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주식은 줄이고 부식은 싱겁게 먹습니다.
- 싱겁게 조리하시고 짠맛 대신 신맛, 단맛을 이용하여 조리하고 고추가루, 후추가루, 마늘, 양파, 생강, 식초, 설탕 등의 양념은 사용 가능합니다.
운동요법
-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할 때는 의사나 운동 처방사에게 문의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체력 수준이나 운동에 대한 흥미에 따라 걷기운동과 더불어 수영, 자전거타기, 낮은 강도의 에어로빅 등이 적합합니다.
- 운동은 일주일에 3~5회 참여하며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요법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수치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 전에 세심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경증 고혈압(140~150/90~99mmHg이하)의 경우에는 2-3개월의 관찰기간을 두고 식이요법을 포함한 생활습관개선을 시행하고, 심한 고혈압 및 진행이 빠른 고혈압의 경우에는 약물로서 조기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와 치료목표 혈압
(LINK https://vimeo.com/244774270/bf78829b03)
- 고혈압의 일차적인 강압목표는 140/90 이하입니다.
-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한 항고혈압제로는 이뇨제, 교감신경차단제, 칼슘통로차단제, 혈관확장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제 등이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이 다르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 혈압은 단지 약을 복용중이기 때문에 낮게 유지되는 것이므로 혈압이 낮아졌다고 해서 임의대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합니다.
고혈압의 경과 및 합병증
(LINK https://vimeo.com/244774281/62444938ee)
고혈압은 진행되면 약 50%에서는 관상동맥질환이나 심부전으로, 약 33%에서는 뇌졸중으로, 10~15%에서는 신부전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심뇌 질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울혈성 심부전, 뇌졸중
- 신장질환: 신장기능장애 - 만성콩팥병, 단백뇨
- 안질환: 안저출혈, 시력상실 등
고혈압의 예방 및 생활습관
표준체중을 유지
표준체중[ (키-100) x 0.9 ] 보다 2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는 20~24 kg/m2 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운동
빨리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타기, 체조 등 유산소운동이 좋으며 적당한 운동량은 최대 심박수(220 에서 자기 나이를 뺀 값)의 40~60% 정도 강도로 1주일에 3~4회, 1회에 30~40 분간 규칙적인 운동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식이
포화지방산과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 저지방 유제품의 섭취를 늘립니다. 하루 6g이하의 염분을 섭취합니다.
절주 및 금연
하루 허용량은 알코올 30g( 맥주 720cc, 와인 300cc, 50도 위스키 60cc, 소주 90cc) 으로 제한하도록 하며, 여자와 체중이 적은 사람은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조절
명상, 요가, 단전 호흡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합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 - 협심증(Angina), 심근경색증(Myocardial infarction)
허혈성 심장질환의 정의
협심증
관상동맥을 통한 심장근육으로의 혈액 공급량이 부족할 때 발생되며 주된 증상은 운동 시 가슴의 중앙부에 발생하는 통증이나 불쾌감, 호흡곤란 등 입니다.
심근경색증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내의 기존의 동맥경화 부위의 프라그의 갑작스런 파열로 인한 혈전 형성으로 인해 혈류 공급이 완전히 차단됨으로, 심근이 혈액과 산소를 공급 받지 못해 괴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증이라 하며, 심장 돌연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 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 원인
주원인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이 관상동맥 내면에 침착되는 것으로 사춘기 이후 시작되어 중년이 되면 누구에게나 발생되는 일종의 노화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구식 식이습관, 운동 부족, 비만 및 노령 인구증가 등으로 관상동맥질환이 증가하는 추 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유병 연령층이 더욱 젊어져 30~40대에서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예방에는 이러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생활 패턴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 기전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심장근육 허혈 발생의 원인은 심근의 혈액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인해 좁아져서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감소하여 생기는 관상동맥협착증이 흔하지만 다른 원인 들도 심근허혈과 협심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과정
- 초기 동맥경화반 소견 : 관상동맥내에 산화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 경화가 시작된 소견을 보이나,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협심증의 경우 : 관상동맥에 심한 동맥경화 덩어리(죽종)가 형성되어 혈관을 심하게 협착시킵니다.
- 근경색증의 경우 : 심하게 막힌 관상동맥에 혈전(핏덩어리)이 생겨 혈관을 완전히 막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
- 협심증의 증상
- 흉골후방의 통증으로 신체활동시(빨리 걸을 때, 계단 을 오를 때, 운동시, 무거운 것을 들 때)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됩니다.
- 차가운 날씨, 식사 후 아침시간에 통증이 더 잘 발생 합니다.
- 통증이 5~15분 지속되다가 안정을 하면 사라집니다.
- 당뇨병 시에는 무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 심근경색의 증상
- 가슴이 터질 듯한 극심한 흉통이 가슴의 중앙부에 15분~20분 이상 지속되며, 설하 니트로글리세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 실신, 오한, 구역,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당뇨병 시에는 미약한 불편감 정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 검사
- 흉통의 특징(병력) : 심근 허혈로 인한 흉통은 발생부위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가슴에서 발생한 통증이 왼쪽 팔의 안쪽이나 어깨, 목 등으로 방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사통이라고 하며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는 흉통의 원인이 심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심전도 검사
-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
- 24시간 생활 심전도(홀터 모니터)검사
- 심초음파 검사
- 심장핵의학 검사
- 동맥경화 협착검사
- 3차원 심장 단층 촬영(3D CT)
- 관상동맥 조영술 : 혈관내 초음파, 압력철선 검사
허혈성 심장질환의 치료
- 생활 양식을 바꾸십시오. - 위험인자의 조절
- 동반된 내과적 질환(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 약물 요법은 꼭 필요합니다 :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처방이 중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복용중인 환자는 치과치료 또는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을 받기 전에 출혈의 위험성 때문에 반드시 심장내과 의사와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심근의 허혈 개선 : 칼슘차단제, 베타차단제, 혈관확장제
- 관상동맥협착의 진행방지 : 항혈소판제
- 관상동맥 조영술(풍선확장술 및 스텐트삽입술)
- 치료 후 관리 :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심장질환이 생기게되면,완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병증에 필히 주의하시고,적당한 운동을 하며 체중 및 식이 조절에 항상 관심을 가지도록 합시다.
심혈관 질환의 생활요법
-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 표준체중 10% 내외인 경우 * 표준체중= (키-100) Ⅹ 0.9
- * 남자 > 37인치, 여자 > 32인치 이면 위험합니다.
- 반드시 금연 하십시오.
- 혈압관리를 하십시오.
- 당뇨병 관리를 하십시오.
- 혈중 콜레스테롤치를 정상으로 유지관리 하십시오.
- 장기간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하십시오.
-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 정해진 시간에 약물을 복용하십시오.
- 주치의와 상담 없이 임의로 중단하지 않기
- 약을 거른 경우 다음 투여 시 두 배로 먹지 않기
- 1회 먹어야 할 용량을 맘대로 조절하지 않기
- 약이 많아도 처방대로 먹기
- 보약이나 건강식품 함부로 먹지 않기
- 상호작용 유의 : 비타민, 감기약, 항생제, 아스피린 등
- 집근처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반드시 현재 복용중인 약처방전 가지고 가기
-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주치의와 상담하기
- [인증범위]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 [유효기간] 2023.12.28 ~ 2026.12.27
예약 및 대표전화 : 1688-0077 COPYRIGHT (C)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ALL RIGHTS RESERVED.